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세대를 넓게 아우르는 규정으로 대개 쓰인다. 흔히 세대론에서 세대 구별이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면 이 세대 규정은 그 폭이 제법 넓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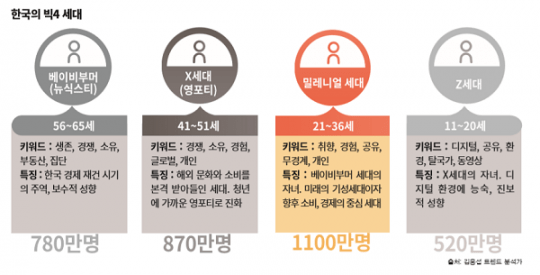
규정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과거보다는 세대 간의 격차랄 게 다소 희미해지고, 더 넓은 범주에서의 공통성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온라인이 삶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무척 커지면서일 것이다.
과거 세대 간 구별이 더 촘촘했던 이유는 그만큼 세대가 활동하는 범주가 명확히 나뉘었기 때문이다. 한 세대가 사회생활에 진출할 때쯤 다른 한 세대는 여전히 학생이거나 미성년자였고, 다른 세대는 이제 한창 가정을 이루고 육아를 할 때였다. 그들은 인생의 시간순에 따라 서로 분단되어 꽤 다른 문화를 각기 만들고 공유하면서, 또래의 특성이라는 걸 만들어갔다.
그에 비하면 온라인의 본격적인 확산은 세대 간의 유행이나 취향, 관계의 스타일, 세계관 등을 더 넓은 범주에서 뒤섞어 버렸다. 그래서 1980년대 초반생이라고 하면 온라인 세계가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삶의 일부로 활용하기 시작한 세대라는 점에서 함께 '밀레니얼'로 묶일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서 댓글을 쓰고, 같은 유행어를 사용하고, 같은 게임을 하며, 같은 웹툰을 보고, 유사한 문제의식과 세계관을 지닌 채 세상을 대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시작된 규정이지만, 우리나라에도 폭넓은 '밀레니얼' 개념은 확실히 타당성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최근 이 세대를 둘러싼 여러 담론이 등장한다. 대개는 기성세대들이 밀레니얼 세대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관찰하여 그에 따라 성격을 부여하는 형식이다.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에 속한 나는 그런 담론들이 '담론을 위한 담론'처럼 보일 때가 자주 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을 '개인주의'나 '나 중심' '효율성' 같은 것으로 단순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이런 식의 규정을 볼 때마다 다소간의 불편함을 느끼곤 한다.

이런 이중성은 밀레니얼 삶의 전반에서 나타난다. 어느 한쪽의 가치에 절대적으로 기울지 않고, 어느 하나를 추구하는가 싶으면 다른 한 측면으로 이동하는 식의 '시소적인 세계관'이 이들에게 자리 잡은 것이다. 이는 좋게 말한다면 균형감각이고,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결정장애 세대'적인 특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결코 한 쪽으로 온전히 넘어갈 수 없이 그런 넘어감이나 치우침 자체에 불안함을 느끼고, 다시 곧장 스스로의 위치를 재점검하면서, 다른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 근본 바탕은 '불안'이다.
기성세대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혹은 사회문화적으로 비교적 공고한 가치관 속에서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인생에서의 어떤 확신 어린 상태를 부여받곤 했다면, 밀레니얼 세대는 처음부터 '확고한 정체성'을 가져본 적이 없다. 모든 가치관은 온라인에서 하나의 '관점'으로 전락하고, 상대적인 것이 되며, 존중해야 될 취향이자, 하나의 의견이 될 뿐이다.
절대적으로 의지할 단일한 신념 대신 이런저런 가치관을 그때그때 시소 타듯이 옮겨 다니며 살아가는 '유동성'이 그 바탕에 깔린 것이다. 내가 그 이전까지 배운 사회적인 담론, 역사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대개 한 시대를 지배하는 단일한 '지배이념'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종종 그런 식의 근본적인 프레임 자체가 점차로 무용해지는 그런 시대가, 세대가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느 하나의 가치관이 폭력적으로 다른 것들을 짓누르거나 지배적이고 이분법적인 이념이 나누어 대립하는 시대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색깔의 마을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다채로운 세계가 공존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밀레니얼이 만들 세계는 그런 것이었으면 싶다.
원문: 문화평론가 정지우의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