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강의하다 과제를 내 줄 때면 따라붙는 걱정이 있다. CHAT GPT에 물어서 그대로 '복붙'하는 걸 어떻게 검증하냐는 문제다. 실제로 작년 학기에 두 학생이 온라인으로 퀴즈를 보는데 답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서 0점 처리한 적이 있다. 부정행위를 한 거냐고 물어봤더니 돌아온 대답은 "질문을 복사해서 GPT에 물어봤고, 그 답을 그대로 갖다 붙였다"는 고백이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생각보다 GPT가 더 신뢰가 가는 소스였던 셈이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다. 업무상 받는 자동차 산업 동향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고 자동차 회사들이 NVIDIA나 DEEKSEEK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들과 협업으로 자율 주행 기술을 개선하고 개발 과정을 최적화하는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인공지능을 활용할 줄 아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의 격차가 커지면서 이른바 인공지능 이해력, AI 리터러시가 필수가 되는 시대가 이미 온 것 같다.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의 일상에서는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와 뉴스를 물어보는 AI 스피커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을 부르는지 일을 시키는 건지 분간하려 열심히 노력한다. 유튜브에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편집하고 자막을 달아주는 쇼츠들이 넘쳐나지만, 그 뒤에 인공지능이 있다는 것을 알기는 쉽지 않다.
챗GPT도 자료를 찾느라 몇 번 물어본 적 있지만 모호한 답변밖에 하지 않았다. 최신 정보는 업데이트되는 사항을 따로 확인해 보라니 번거로웠다. 인공지능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일은 딴 세상 사람들 이야기로 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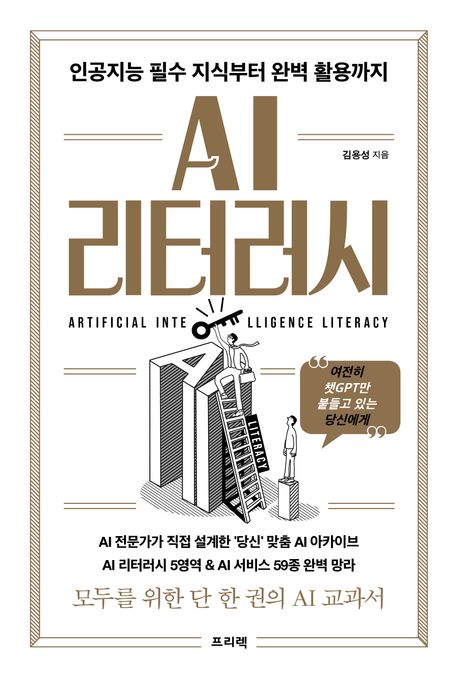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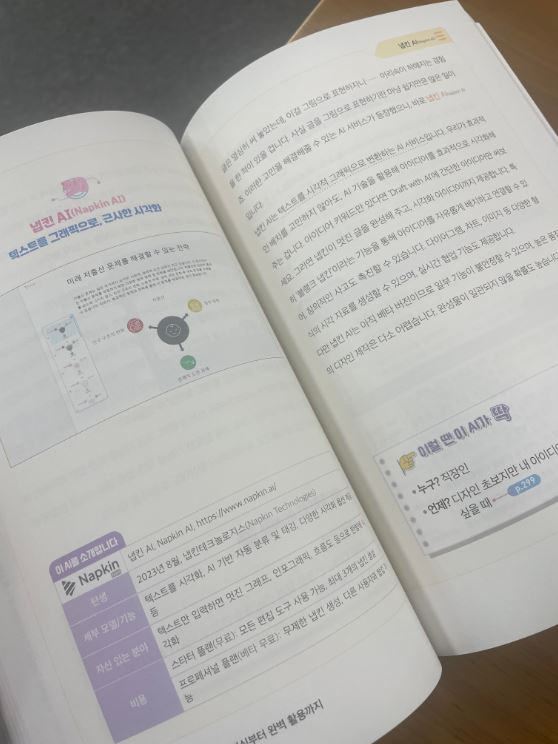
덕분에 나도 (이제야) CHAT GPT를 유료 버전으로 가입하고 클로드, 파이어 플라이, 캡컷, 다글로, 냅킨 같은 서비스들을 사용해 보기 시작했다. 2~3주 책과 함께 시도해 보니 써서 좋았던 지점과 불편한 지점이 공존했다.

이제 첫걸음이니 불편한 건 당연하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는 뒤뚱거리고 넘어지지만, 익숙해지면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페달을 밟는 쾌감을 느낄 수 있다. 인공지능도 그럴 것이다. 세상에 수많은 서비스가 넘쳐 나지만 나에게 맞는 짝을 찾는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한다.
내가 보내는 시간을 돌아봐야 한다.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고, 반복되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 시도해 보자. 그중에서 내 취향과 의도에 맞는 결과물을 내는 곳을 찾아 익숙해져야 한다. AI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서, 이 책이 참 고마웠다.
원문: 이정원의 브런치
이 필자의 다른 글 읽기

